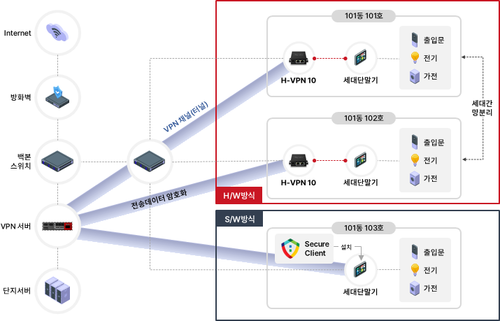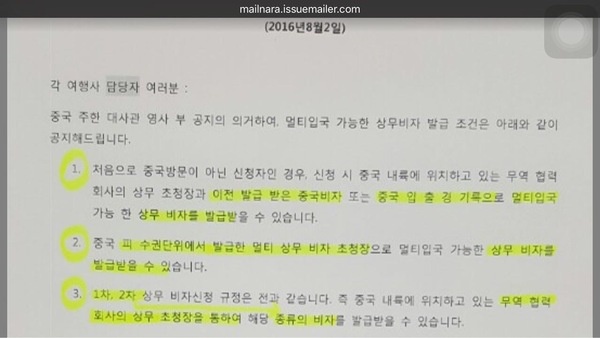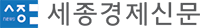|
제기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왕산로의 보도는 오,가는 행인들로 늘 붐빈다. 경동시장으로 들어가는 여러갈레의 골목과 연결돼 있고, 상가와 노점 사이의 길이 좁은데다가 물건들을 기웃거리고, 흥정하는 이들이 길을 막아 신경이 곤두세워진다. 때로는 툭툭 부딪히기도 하고, 걸음을 주춤거리기도 한다. “이 잡년아~, 내 돈 내놔. 요망한 불여우 같으니라구” “지랄하네. 새빨간 거짓말로 생사람 잡지 마. 옘병할 여편네야~” 구경꾼들로 꽉 막힌 행길 위로 악에 받친 두 여성의 맞고함소리가 날카롭게 올라왔다. 거스름돈을 내놓으라는 고객과 돈을 아예 주지 않았다는 노점상인 사이의 성난 시비였다. 3천원 어치의 생강과 7천원의 잔돈을 둘러싸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다툼은 점점 거칠어져서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몸싸움으로까지 치달았다. 맹렬해진 닭싸움을 말린 이는 배낭을 메고 지나던 늙수그레한 대머리 아저씨였다. 그 아저씨는 호통을 쳐가면서 엉켜있는 여자들을 억지로 떼어놓았다. 식식거리는 두 여성을 따로 갈라놓고는 지갑을 꺼냈다. 생강을 사려던 여인에게 만 원권 한 장을 쥐어주며 “어서 다른 가게로 가세요”라면서 밀어냈다. 사양 끝에 돈을 받은 손님은 눈물을 훔치면서 떠났다. 아저씨는 “생강은 보약이라지”라며 팽개쳐진 생강봉지를 주워 배낭에 넣고 값을 치뤘다. 계면쩍은 표정으로 돈을 받는 상인의 충혈된 눈에도 눈물이 보였다. 구경꾼들이 흩어지자 대머리 아저씨는 시장 쪽으로 덤덤하게 걸어갔다. 갈지자 걸음의 허벌렁이 노틀, 안짱다리에다가 허리까지 굽은 호호백발 할머니, 호두껍질처럼 주름잡힌 깡마른 안늙은이, 허름한 입성에도 자세는 제법 바른 사내, 손구르마를 달달 끌고가는 아줌마들은 느려터졌다. 그들의 뒷줄을 따르면서 아저씨는 골돌히 생각했다. ‘어느 한 쪽은 분명히 도둑심보였을 텐데 어째서 양 쪽이 다 눈물을 흘렸을까? 혹 바빠서 돈 받은 일을 깜빡했을까? 어쩌다 신경전이 일자 오기가 붙었을까? 부풀려진 물욕? 쌓였던 울화의 폭발? 어떤 경우이건 재판을 벌여도 쉽게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태연하게 걸어서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도 대머리 아저씨는 앞서 벌어진 다툼의 여운을 재울 수가 없었다. 눈물을 흘린 두 여인의 잔영이 시장 안 사람들의 모습 위에 자꾸 겹쳐지는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어가며 중얼거렸다. “이 거대한 시장에 드나드는 저 많은 인파들에게 눈물의 너울을 씌우다니!“ 그는 피곤해지는 눈을 껌뻑거리면서 청과상가로 접어들었다. 과일골목은 점포마다에서 외쳐대는 호객소리로 시끌벅적해서 활기가 넘쳤다. 빛갈 좋은 오만가지 과일들이 수북수북 쌓여있고, 가격도 동네가게보다 많이 낮았으며, 거래도 척척 이뤄졌다. 그는 사람들을 따라 죽 둘러보다가 한 가게에 멈춰서 신고배 한 무더기를 샀다. 5천원에 7개면 다른 가게보다 3개나 더 많아서 눈길을 끌었던 것이다. 손해를 보고라도 재고를 없애야 한다는 점주의 한탄과 웬 횡재냐는 욕심의 만남이었다. 그는 멋쩍어져서 사과 한 바구니를 더 사면서 옆집에 붙은 <근조(謹弔)> 표지를 가르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주인 아저씨가 폐암으로 어제 돌아가셨어요. 대왕코너 화재 때 다 태우고 맨 손으로 여기 와서 고생만 하시고, 이제 겨우 자리잡았는데~” 긴 설명이 돌아왔다 “가족은요?” “아주머니는 억장이 무너지겠지요. 안 쓰러지셨나 모르겠어요. 딸은 시집가서 부산에서 잘 살고 있고, 잘난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공부도 시원찮다는데~” 대머리 아저씨는 청과상거리에서 나와 바로 입구에서 귤과 바나나, 밤 등을 벌려놓은 노점상 앞을 지나며 귤에 눈길을 주었다. 아저씨를 보자 쪼그리고 앉아있던 노파가 얼른 일어나 물건이 좋고, 싸다며 사라고 졸라댔다. 땟갈이 좀 떨어지는 듯 싶어 아저씨가 그 옆의 노점으로 잠깐 시선을 돌리자 노파는 쌩~ 돌아 앉으며 들릴락말락 낮게 ‘재수가 영 없는 날’이라고 꾸시렁거렸다. “어머니, 귤 좋은 걸로 한 봉지 주세요.” 아저씨의 말에 놀란 노파의 반응은 빨랐다. “ 아이구, 다~ 좋아요. 얼마나 달다구요.” 다시 일어나 검은 플라스틱 봉지에 귤 한 꾸러미를 넣어주는 노파의 재빠른 손등이 마른 계피껍질 같았다. 대머리 아저씨는 채소와 산채류가게들을 지나 밭작물과 곡식종류, 임산물, 견과류, 건어물, 양념류 등의 시장을 두루 다니면서 호두와 땅콩, 곶감, 김, 황태채를 조금씩 샀다. 매매는 밀고당기는 흥정없이 깔끔했다. 푸줏간과 가금류, 해산물 업소들을 지나면서 그는 인간들이 참 다양한 먹잇감을 개발해냈다고 새삼 놀라워 했다. 줄잡아 만 가지도 넘는 식재료가 널린 경동시장은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담은 거대한 화폭이라는 인상도 받았다. 약령시 입구에서 대머리 아저씨는 오래 전 약령시장에서 들은 시장의 내력을 더듬었다. 경동시장의 뿌리는 조선시대의 구호기관 보제원이며, 전국 한약재의 70%를 공급하는 약령시가 형성되었다는 전언이다. 또 한국전 이후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재배된 농축산물이 성동역과 청량리역을 통해 야금야금 반입됨으로서 큰 전통시장의 면모를 갖추었고, 서울의 급성장과 함께 오늘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했다는 역사도 떠올렸다. 제기동과 용두동, 전농동 일대의 10만 평방미터에 얼추 천여 개의 점포와 그와 비슷한 수의 노점상, 4백여 개의 약재상이 들어있어서 무려 3천여 명이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하루에도 대략 10만 여명의 인파가 바글거리며 왕래하고 있다니 놀랄 일이었다. 어둑어둑해지자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새벽에 여는 도매시장은 오후에 이미 마감했겠지만, 번화한 중심의 소매업소는 한산하게나마 아직 문을 열고 있었다. 어떤 가게 앞에서는 종업원이 물을 뿌려 바닥의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 물에 때로는 사람들의 눈물도 섞이겠다는 헛생각에 아저씨의 표정이 시무룩해졌다. 시장기 때문일까? 그는 후미진 골목 속의 맛집 [양평해장국]으로 들어가 배낭을 벗고 자리를 잡았다. 식당 안에는 예상밖에 6~7명이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결같이 묵묵히 뚝배기 한 그릇씩을 뚝딱 비우고 떠나곤 했다. 지치고 허기져서 짓는 표정들로 보였다. “어서 오세요. 늦으셨네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식당 여주인이 한 손님을 반겼다. “괜찮기는요. 맨날 그 모양이지요. 여기는요?” 단골인 듯한 중년 여성의 대꾸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애들 뒷바라지가 걱정이지만~. 대머리 아저씨가 해장국을 천천히 먹고 나오니 시장은 거의 문을 닫았고, 몇몇 가게만이 내부정리를 하고 있었다. 이따끔 환경미화원도 얼씬거렸다. 전통시장의 쓸쓸한 파장의 뒷모습은 스치는 찬 바람에 더욱 스산했다. 현대식 대형마트에 젊고, 부유한 고객들을 빼앗기고 뒤쳐지는 덩치 큰 늙은 시장의 눈물이 보일듯말듯 어른댔다. 대머리 아저씨는 이날 경동시장의 소묘를 글로 남기기로 마음 먹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