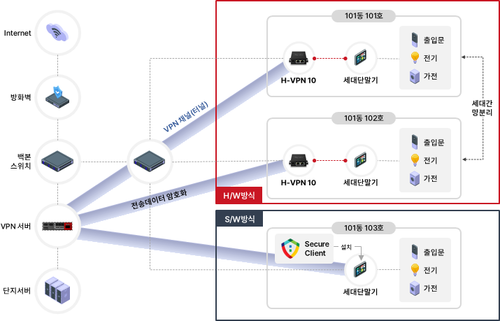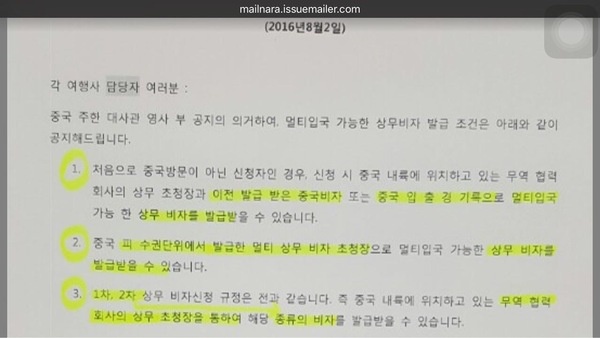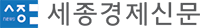우주의 혼이 파편으로 쏟아져 내려 광란의 군무를 추고 있는가 거친 벌판에서 폭설에 휘감겨 방황하는 갈대 포효하는 갈증 어디 가서 붉은 피 한 방울 똑 떨어진 자욱 터-억 만나랴 시어詩語가 된 감상에 떠밀려 집을 나섰다. 눈이 세상을 묻어버릴 기세로 펑펑 쏟아져 내렸다. 전철역에서 내려 한 시간쯤 걸어 외진 시골로 접어들었을 때도 함박눈이 흩뿌려 가까운 앞도 가리기가 힘들었다. 산은 이미 구름 속에 함몰된지 오래이고, 샛터 마을도 형체만 가물거렸다. 길은 하얗게 지워져 이따끔 윤곽만 삐죽이었다.그 위에 눈은 성이 차지 않는 듯 옹골지게 퍼부어댔다. 돌부리인지, 눈얼음인지 돌출이 신발코에 툭툭 차이고, 눈 위를 밟았는데도 발은 움푹움푹 빠지곤 했다. 강행군이 이어지면서 젖어드는 신발 속으로 차거움이 스미고, 발은 굳어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든 팔도 뻐근해져 좌우로 자주 바꾸어야만 했다. 냉기가 옷 틈새로 파고들어 시렸으며, 콧속도 매웠다. 날이 섰던 결기도 서서히 몸을 빠져나갔다.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 뿐이었고, 보이는 것은 떼몰려 덤비는 눈발이었다. 무거운 걸음을 계속 내딛였다. 덕지덕지 쌓이는 생활을 벗어나 하얀 세상에서, 그 흰 세상을 짓는 거대한 역사役事 속에서 무슨 새로움의 단초라도 찾아보려는 발길이었다. 자! 어디까지 갈까? 신神이 내리는 구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인가, 시대를 꿰뚫는 철리哲理를 터득할 때까지인가, 아니면 지고한 예술의 경지가 느껴질 때까지인가? 아무리 걸어도 거룩한 종교도, 명쾌한 철학도, 뭉클한 예술도 단서조차 보이지 않았다. 바로 옆에 가르침이 있는데 분분설紛紛雪에 가려서 찾지 못하는 건지, 심장이 얼어 작동하지 않는 건지, 애초에 가당치도 않은 차원을 관념만으로 겨냥했던 건지 갈증만이 보채댔고,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집중이 없는데 실체가 잡힐 리가 없었다. 하얀 입김만 연상 공중에서 산화散華해 버리곤 했다. 몸이 움츠러들수록 생명에 대한 불안감이 일기 시작했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늘어났다. 전동차가 달려가는 소리가 아득히 들렸다. 바람소리를 배경음으로 들리는 교향악이었다. 거장 구스타보가 지휘했던 말러의 교향곡보다도 더 정교한 화음인 듯 싶었다. 무심코 흘려버렸던 그 소리가, 때로는 공해로 여겨졌던 그 소리가 어찌 그리 가슴에 와 닿는지! 그 차를 타면 집으로 갈 수 있을 터였다. ‘가서 몸뚱이만 빠져나온 생활과 가족, 모든 인연들, 그 익숙한 삶의 얼개들과 만날 수 있으리라, 집에 떼어놓고 온 나의 분신과 합쳐지리라’ 하는 소소한 소망이 솟았다. 문득 폭설이 예고된 서해안지역, 눈의 산맥에 갇혀 있을 친구가 떠올랐다. 몇 시간 전에 전화로 안부를 물었을 때는 눈걱정은 커녕 설국雪國이 아름답다는 답을 산울림처럼 알려오기는 했다. “반갑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 그 친구는 노래의 후렴같이 “친구야”를 붙인다. 친구를 따듯이 대하려는 우정도 울어나지만, 친구를 통해 허전함을 메우려는 헛헛함도 묻어난다. 그는 세상과의 인연을 훌쩍 떠나 서산의 바닷가로 내려가 허름한 여염집을 꾸며 살기 시작했다. 지난 해에는 그곳보다도 더 외딴 산골짜기로 들어가 벼랑에 세워진 사찰의 진입로에 자리를 잡았다. 묘지에 둘러싸인 구릉을 깍아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지낸다. 가끔 전화를 걸면 토방에 불을 지피고 있다든지, 무우와 배추를 거두고 있다는 소조蕭條한 음성이 들린다. 금융계의 고위직까지 지낸 그가 홀연히 세속을 등지고 풍광이 유려한 산자락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섭생하는 모습이 한폭의 동양화 같다는 평을 듣는다. 이따끔 그가 상경하든지, 친구들이 작당해 내려가 해후할 때면 그는 모든 걸 풀어버린 듯 질퍽하게 즐거워 하고, 우리도 덩달아 즐겁다. 그럴 때 나의 시선에는 강에 비친 산 그림자처럼 그의 내면에 침잠해 있는 쓸쓸함이 스친다. 멀리 떼어놓고 간 자신을, 그래서 잘려나간 자신을 그리워하는 소회이리라. 내가 나의 상당 부분을 잘라 멀리 방치해 놓은 것은 미국에서 한국의 회사에 사표를 내고 현지에서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생소한 새 일거리에 전념하느라 나는 나의 상실을 괘념할 여유조차 없었다.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미래만이 눈 앞에 아른거렸다. 분명 착각과 착시였다. 청춘을 쏟아 쌓아온 경력의 끈을 놓아버리자 유형 무형의 옛 관계들도 자연히 멀어졌다. 나를 버티게 해주었던 나의 정신세계도 분해돼 떨어져 나갔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절단의 아픔과, 잘라져 나간 나의 아림은 보재기에 싸여 골방에 처박혀 묵혔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숨을 돌리자 골방에도 엷은 빛이 새어들었다. 달빛이 휘엉청 밝은 가을 밤 벌레소리 구슬프거나, 오색찬연한 낙조의 바닷가에 갈메기 떼 멀리 날면 나는 분단의 상처로 깊은 숨을 몰아 쉬었다. 멀리 고국에 남겨진 모든 것들, 나의 뿌리, 나의 정서, 나의 가치관, 나의 꿈, 그리고 그것들을 에워싼 인간관계들이 내팽겨쳐져서 나뒹굴고 있다가 가녀리게 손짓을 했다. 가끔 알려지는 내 분신의 근황은 구성지게 전해졌다. 흡사 부모를 여윈 자식들이었고, 화통에서 떨어져 나간 열차칸이었다. 이쪽에서도 그쪽에서도 상실은 따로따로 내장돼 앓고 있었던 것이다. 눈 속의 행진을 멈추었다. 추위로 인한 고통은 더해지고, 기력은 차츰 쇠잔하고 있었다. 어느덧 더 허약해진 탓일까? 집을 나설 때 막연하게 꿈꾸었던 각성, 일상을 벗어나서 맞아보려던 어떤 낯설음에 대한 열망은 눈바람을 타고 흩어져 버렸다. 모진 고행으로 도달했다는 인걸人傑들의 깨달음은 자국도 보이지 않았고, 고뇌 끝에 나꿨다는 사유思惟의 실마리도 오리무중이었다. 극한 상황에서 번쩍였을 예술의 혼魂도 거기에 없었다. 한계상황을 넘기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는 않았고, 도약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충동도 일었다. 그러나 나는 여지없이 작은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싶은, 해탈보다는 일상이 더 소중하다고 매달리는 범부凡夫였다. 점점 부푸는 안전지향의 소심한 심리에 말려 퇴로를 택했다. 눈밭에서 식어가고 있는 나의 생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떠도는 또다른 나의 유기를 막기 위해서 아직 발자국이 남아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돌아가서 무슨 큰 수를 얻겠는가 만은 그래도 그나마 가꾸어온 삶과 인성人性의 기조, 그리고 서로 버팀목이 돼 주는 신뢰들을 만나고 싶었다. 꿈은 언제나 현란하지만, 일상은 버릴 수 없는 대지垈地인 것을---. 얼마를 질척였을까? 길가에서 빼꼼히 내다보고 있는 조그만 가게에 들어가 차 한 잔을 사서 들었다. 차향이 와락 달려들었고, 컵에서 옮겨지는 온기와 식도로 흘러들어가는 뜨거운 찻물이 언 몸을 단숨에 데워 주는 듯 했다. 집쪽으로 가는 전철역도 지척으로 다가와 있었다. 반대 쪽에는 두 시간 정도 헤맸던 들판이 뿌옇게 보였다. 아직도 눈발이 어지럽게 휘날려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안에서 힘들어 하던 모습이 아련히 떠올랐다. 전설의 눈사람이거나 일종의 야생동물이었다. 폭설이 쏟아지는 벌판에는 내가 몇 시간도 머물 곳이 없었다. 함께 어울릴 세상도 없었고, 딩굴며 섞일 문화도 멀었다. 우산 위에 떨어진 눈을 털며 눈사람에서 사람으로 돌아와 보는 눈은 금간 질그릇 눈아, 어찌 너희들의 더깨 위에 앉지 않고 거기에 서로 보듬기도 어려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