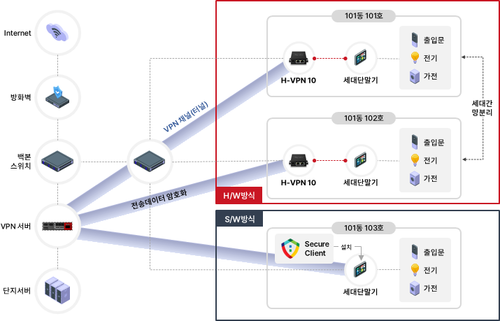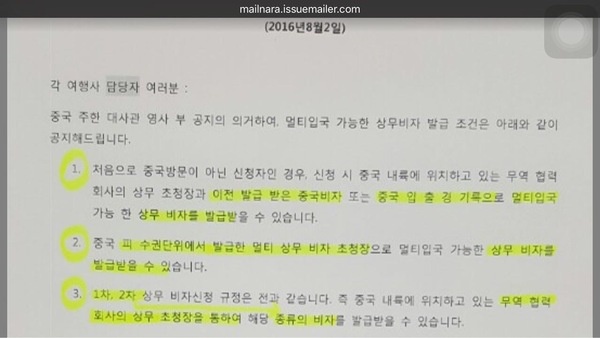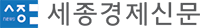|
바이칼 호의 눈보라치는 바람 소리
남정임과 최순임 두 사람은 마침내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역에 도착해 최석이 편지를 썼던 바이칼 호반의 그 부랴트족 노파의 집을 찾아간다. 그러나 최석은 그곳에 없었다. 정임의 병은 점점 깊어져 간다. 하는 수 없이 순임 혼자 주인 노파와 함께 아버지 최석을 찾아 나섰다.
순임이 최석을 찾아 나서고 난후 정임은 N에게 편지를 쓴다.
선생님. 저는 지금 최 선생께서 계시던 바이칼 호반의 그 집에 와서 홀로 누웠습니다. 순임 형(순임과 정임은 동갑이다)은 주인 노파와 함께 F역으로 최 선생을 찾아서 오늘 아침에 떠나고 병든 저만 혼자 누워서 얼음에 싸인 바이칼 호의 눈보라치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열은 삼십팔로부터 구도 사이를 오르내리고 기침은 나고 몸의 괴로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선생님. 저는 하느님을 불러서 축원합니다, 이 실낱같은 생명이 다 타버리기 전에 최 선생의 낯을 다만 일 초 동안이라도 보여지이라고.
------
선생님. 죽은 뒤에도 의식이 남습니까. --- 죽은 뒤에는 혹시나 생전에 먹었던 마음을 자유로 펼 도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립고 사모하던 이를 죽은 뒤에는 자유로 만나 보고 언제나 마음껏 같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까.
이런 일을 바라는 것도 죄가 됩니까.
정임의 편지는 이처럼 최석에 대한 사모의 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십여 일 후 순임으로부터 ‘아버지의 병이 급하니 돈을 가지고 곧 오기를 바람’이라는 편지가 N에게 왔다. 순임이 마침내 최석을 찾았지만 그가 이미 중병에 들어있다는 얘기였다. N은 곧 그들을 찾아 서울을 떠났다.
다음은 N이 비행기와 기차로 이르쿠츠크까지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 때(1930년대 초반)도 이러한 여행이 가능했던 모양이다.
전보 발신국이 이르쿠츠크인 것을 보니 B 호텔이라 함은 이르쿠츠크인 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최석 부인에게 최석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전하고 곧 여행권 수속을 하였다. 절망으로 알았던 여행권은 사정이 사정인 만큼 곧 발부되었다.
나는 비행기로 여의도를 떠났다. 백설에 개개한 땅을, 남빛으로 푸른 바다를 굽어보는 동안에 대련을 들러 거기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고 봉천, 신경, 하얼빈을 거쳐 치치하얼에 들렀다가 만주리로 급행하였다.
웅대한 대륙의 설경도 나에게 아무러한 인상을 주지 못하였다. 다만 푸른 하늘과 희고 평평한 땅과의 사이로 한량없이 허공을 날아간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두 친구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아무 여유도 없는 까닭이었다.
만주리에서도 비행기를 타려 하였으나 소비에트 관헌이 허락을 아니하여 열차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초조한 몇 밤을 지나고 이르쿠츠크에 내린 것이 오전 두 시. 나는 B 호텔로 이스보스치카라는 마차를 몰았다.
시베리아의 달

N은 B호텔에 도착해 순임을 찾았으나 순임은 호텔에 없었다. 마침 호텔의 한 서양 노파가 순임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N에게 최석이 아직 살아있으며, 최석과 딸 순임은 그곳에서 삼십마일이나 떨어진 F역에서도 썰매로 더 가는 삼림 속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정임의 소식은 오래 듣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N은 이튿날 그 노파와 함께 이르쿠츠크를 떠나 최석을 찾아 간다.
다음은 그 서양 노파와 함께 말이 끄는 썰매(이스보스치카)를 타고 눈덮인 시베리아 숲 사이로 최석을 찾아가는 N의 묘사다.
우리는 썰매 하나를 얻어 타고 어디가 길인지 분명치도 아니한 눈 속으로 말을 몰았다.
바람은 없는 듯하지마는 그래도 눈발을 한편으로 비끼는 모양이어서 아름드리나무들의 한쪽은 하얗게 눈으로 쌓이고 한쪽은 검은 빛이 더욱 돋보였다. 백 척은 넘을 듯한 꼿꼿한 침엽수-전나무 따윈가-들이 어디까지든지, 하늘에서 곧 내리박은 못 모양으로 수없이 서 있는 사이로 우리 썰매는 간다.
땅에 덮인 눈은 새로 피워 놓은 솜같이 희지마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구름 빛과 공기 빛과 어울려서 밥 잦힐 때에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이 연회색이다.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새도 날지 아니하건마는 나무 높은 가지에 쌓인 눈이 이따금 덩치로 떨어져서는 고요한 수풀 속에 작은 동요를 일으킨다.
우리 썰매가 가는 길이 자연스러운 복잡한 커브를 도는 것을 보면 필시 얼음 언 개천 위로 달리는 모양이었다.
한 시간이나 달린 뒤에 우리 썰매는 늦은 경사지를 올랐다.
말을 어거하는 아라사 사람은 ‘쭈쭈쭈쭈, 후르르’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입으로 말을 재촉하고 고삐를 이리 들고 저리 들어 말에게 방향을 가리킬 뿐이요, 채찍은 보이기만 하고 한 번도 쓰지 아니하였다. 그와 말과는 완전히 뜻과 정이 맞는 동지인 듯하였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차차 추워짐을 깨달았다. 발과 무르팍이 시렸다.
N이 마침내 최석의 집에 도착한다. 최석의 병세가 심각하다. (8편에 계속)